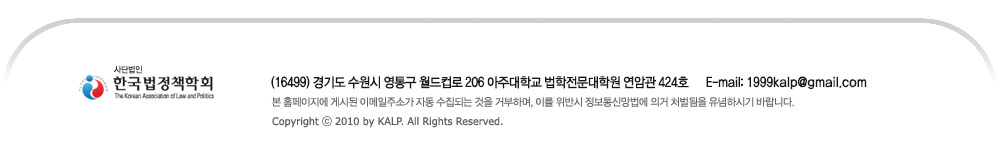[목차]
Ⅰ. 서 언
Ⅱ. 라이히법원의 판결(1943년 2월 8일)
Ⅲ. 유언의 개봉 제도
Ⅳ. 전후 판례의 동향
Ⅴ. 학 설
Ⅵ. 결 어
[국문요지]
민법에 의하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. 그런데 유언에 대해서는 한정된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하다는 유언사항법정주의가 타당하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이해인 것 같다. 이는 마치 자명한 원칙인 양 특별한 근거 없이 서술되는 경우가 많은데, 민법의 규정상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나, 포괄적 유증 또는 특정적 유증이 인정되는 결과 넓은 범위에서 유언자에 의한 사후의 재산관계 형성을 용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이른바 유언사항법정주의의 효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.
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전 자체에서 유언사항법정주의를 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, 유력한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, 유언사항법정주의가 학설상 널리 인정되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언뜻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독일의 법적 상황은 우리의 그것과 매우 근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. 그런데 유언사항법정주의라는 하나의 법원칙의 비교를 넘어, 피상속인이 어떠한 범위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기능주의적인 문제를 설정하면 독일법에서의 상황은 우리와는 대폭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즉, 유언자는 유언서 안에서 유언 이외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,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언과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.
본고에서는 독일법에서 유언서 중 법정의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유언과는 독립적인 의사표시·법률행위로서 취급한다는 널리 인정되어 온 법률구성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.